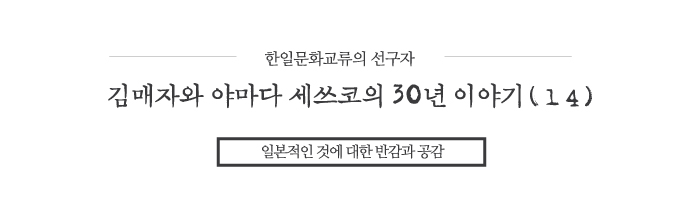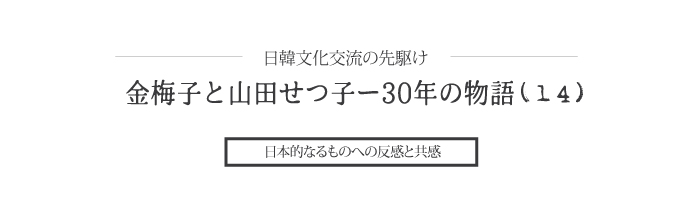글 | 이토 준코
일본적인 것에 대한 반감과 공감
이 부토페스티벌이 한국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진 걸까?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보기 위해서 "예술자료원"을 찾았다. 창무회 자료들도 여기에 기증됐으며 순서대로 아카이브화 된다고 한다. 이 연재를 진행하면서도 이 곳에 보관된 사진 자료를 빌려 쓰기도 했다. 다행이 여기에는 "도쿄국제연극제' 88이케부쿠로"등 공연팜플렛 이나 전단들도 잘 보관되어 있다.
멋진 자료보관실을 보면서, 지난 20여년 사이에 한국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김매자가 포스트극장 세운 동기 중의 하나였던 "무용전문건물을 지어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자료를 보관 하겠다 "는 뜻을 정부가 제대로 이어받아 실현해 준 것 같았다.
1993년 여름의 부토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무용예술](현: 월간[몸]) 1993년 7.8월호가 예고편으로 부토 특집을 짰고 공연 평으로는 월간<춤>의 무용평론가 김태원 씨의 글이 있다.
"창무예술원이 주최하고 포스트극장에서 열린 [부토~세기말의 계보] (8월20일~9월4일) 페스티벌은 춤 단체의 기획에 의한 아마도 가장 알차며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었던 국제적인 춤 교류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월간[춤] 10월호"몽상과 은하의 무용 형식"p82)
"이것은 아마도 일본이 최근에 급속히 선진화 되어가는 속에서 우리의 질시나 경멸감, 적의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가 싶다"(상동 p82)
김태원 씨의 공연 평에는 여러 작품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흥미롭긴 하지만 작품 평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월간<객석>에 게재된 이상일 씨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반감과 공감 ― 창무 예술원 일본부토페스티벌")의 내용을 첨부한다.
"반공교육과 함께 반일교육을 철저히 받은 세대일수록 '일본적인 것'은 그대로 반감 유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일본적인 것은 유행의 대상일 뿐이다"(월간[객석] 1993년 10월호 p238)
김태원 씨는 "대중의 관심"에 주목했는데 이상일 씨는 " 젊은 세대" 에 대해 이렇게 언급 한다.
"기성 세대인 나는 반감과 공감의 기묘한 심정으로 공연을 지켜본 반면 젊은 세대들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만 두드러져 보였다"(동상)
이 글들이 모두 일본어로 번역되어 [서울의 일본부토페스티벌]라는 책자에도 실어졌다. 이 페스티벌에 대한 한국인들의 마음속 갈등이 과연 일본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을까?
서울은 [부토적]이다
1970년대부터 부토의 사진을 계속 찍었던 사진가 고 카미야마 테이지 로(1948~2014)은 "부토성" "부토적"라는 말을 자주 썼다. 60년대 말 일본에서 태어나고 유럽에 간 "부토"(BUTOH)는 그 충격을 받은 자에게는 마치"하나의 철학" 이었다. 소설가나 시인들 중에는 부토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진가는 그저 묵묵히 "부토적 순간"을 찍어둘 뿐이었다.
지난 호와 이번 호에 개재된 부토사진은 '카미야마'가 사진담당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16일간 이어진 공연을 찍어둔 기록의 일부다. 말이 별로 없는 그였지만 처음 방문한 서울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의 말을 전했다.
"여기는 너무 [부토적]이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페스티벌에서는 일본인 댄서만 춤을 췄다. 국제 페스티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댄서들의 경연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 댄서들이 호흡을 맞춰야 할 상대방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였다.
카미야마와 마찬가지로 70년대부터 부토의 곁에 있던 조명가 아이카와 마사아키(1949~2010)는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그 뒤에도 계속 한국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왜 우리가 서울을 선택했나?"라는 질문에 스스로 이런 대답을 남겼다.
" 움직이고 있다.. 다양하게. 그 방향은 일정하지 않는다. 그런 방향에 부토를 가져가는 것이 나는 찬성한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일정한 상황에 잡아매면 안 된다. 서울은 그 조건에 딱 맞다. 평가는 항상 50%50%가 좋을 거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다"([서울의 일본부토페스티벌])
김매자는 "지금 부토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한국무용계 전체에게 필요하다 "고 했지만 이것은 일본 부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이 아니고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부토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몸으로 느껴야 더 하나의 길이 생길 수 도 있다. 적어도 여기서 동양적 신체는 보색 역할도 못한다.
마지막에 남상길이 23년전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축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모든 공연을 볼 수 있는 전체관람권을 구매한 사람 중에서 포스트극장 앞의 거리를 매일 철협 소리를 울리며 리어카를 끌고 고철을 모으고 다니던 청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주 맑은 표정의 이 청년은 마지막 토론회까지 참석해 주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이번 페스티벌은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