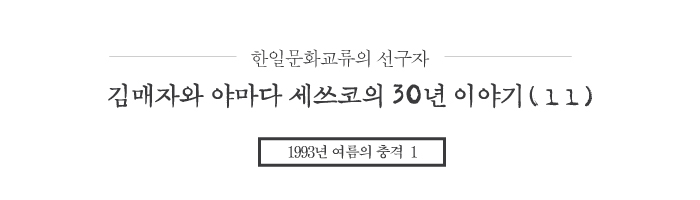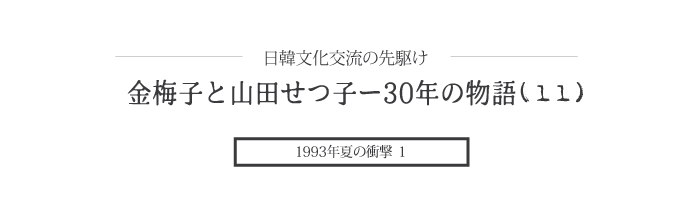글 | 이토 준코
제1회 창무국제무용예술제 "부토-세기말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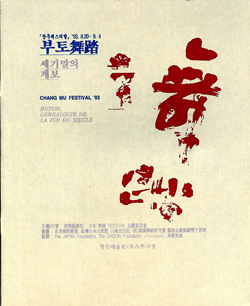 1993년 여름, 필자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산지 3년, 한국생활에도 그런대로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어느 날 학교동료가 "홍대 앞 극장에서 일본 부토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티켓을 사 주지 않겠냐"고 했다.
1993년 여름, 필자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산지 3년, 한국생활에도 그런대로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어느 날 학교동료가 "홍대 앞 극장에서 일본 부토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티켓을 사 주지 않겠냐"고 했다.
"일본의 부토?"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있을 때 산카이 주쿠 공연을 본 적이 있었고, 연극을 좋아하였기에 마로 아카지(麿赤兒)의 다이라쿠다칸(大駱駝鑑)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프로그램에 소개된 출연자 중에서 아는 이름은 오오노 카즈오(大野一雄)뿐. 대다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부토는 수많은 전위예술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것"에 대한 반가움이 있었다.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나 위성방송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문화에 대한 제한도 많았다. 학교 강의가 있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2주간의 전체관람권을 샀다. 처음에는 본전을 뽑지 못할까 걱정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되어 버렸다. 본전을 못 뽑기는커녕 학교 강의를 미루면서까지 매일 극장에 다녔고, 결국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 심지어 축제의 스태프 일까지 했다.
그만큼 부토는 충격이었다. 필자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 그곳에 있었다.
김매자와 창무회 사람들을 만난 것도 그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놀랄 만큼 뒷바라지에 전념했었다. 출연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가고, 리허설 준비를 열심히 돕고, 공연 날에는 극장 입구에서 티켓 접수를 했다.
"왜 일본 무용가만 춤을 추고, 한국 무용가는 춤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기회에 김매자에게 물어 보았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국제 페스티벌'이 많지만, 보통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무대에 선다. 그 중에는 '국제'라는 타이틀을 원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수의 외국인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제1회 창무국제무용예술제는 '부토-세기 말의 계보'란 제목 아래, 출연자는 모두 일본인 무용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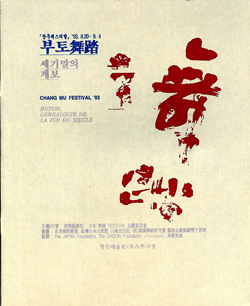
"일본의 부토?"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있을 때 산카이 주쿠 공연을 본 적이 있었고, 연극을 좋아하였기에 마로 아카지(麿赤兒)의 다이라쿠다칸(大駱駝鑑)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프로그램에 소개된 출연자 중에서 아는 이름은 오오노 카즈오(大野一雄)뿐. 대다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부토는 수많은 전위예술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것"에 대한 반가움이 있었다.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나 위성방송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문화에 대한 제한도 많았다. 학교 강의가 있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2주간의 전체관람권을 샀다. 처음에는 본전을 뽑지 못할까 걱정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되어 버렸다. 본전을 못 뽑기는커녕 학교 강의를 미루면서까지 매일 극장에 다녔고, 결국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 심지어 축제의 스태프 일까지 했다.
그만큼 부토는 충격이었다. 필자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 그곳에 있었다.
김매자와 창무회 사람들을 만난 것도 그 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놀랄 만큼 뒷바라지에 전념했었다. 출연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가고, 리허설 준비를 열심히 돕고, 공연 날에는 극장 입구에서 티켓 접수를 했다.
"왜 일본 무용가만 춤을 추고, 한국 무용가는 춤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기회에 김매자에게 물어 보았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국제 페스티벌'이 많지만, 보통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무대에 선다. 그 중에는 '국제'라는 타이틀을 원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수의 외국인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제1회 창무국제무용예술제는 '부토-세기 말의 계보'란 제목 아래, 출연자는 모두 일본인 무용가였다.
왜 일본부토페스티벌을?
김매자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부토를 찬찬히 잘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기념할 만한 제1회 국제페스티벌이니, 이왕이면 더 많은 나라의 무용가를 초대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 당시에는 반감을 살 염려도 있는 일본 무용가만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저는 여러 나라의 팀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1개국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용가의 참여는 생각하지 않았죠.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한국무용계 전체에 있어도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해도 일본의 부토라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을까.
"물론 축제의 첫 회를 일본의 부토로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죠. 뒤에서 말도 많았고요.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에는 부토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춤이었고 한국무용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매자는 "공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맞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김매자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부토를 찬찬히 잘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기념할 만한 제1회 국제페스티벌이니, 이왕이면 더 많은 나라의 무용가를 초대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 당시에는 반감을 살 염려도 있는 일본 무용가만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저는 여러 나라의 팀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1개국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용가의 참여는 생각하지 않았죠.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한국무용계 전체에 있어도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해도 일본의 부토라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을까.
"물론 축제의 첫 회를 일본의 부토로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죠. 뒤에서 말도 많았고요.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에는 부토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춤이었고 한국무용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매자는 "공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맞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포스트 극장
이 시기는 한국 무용계뿐 아니라 김매자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교직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무용가로 독립하면서, 동시에 무용 전용 극장인 "포스트 극장"의 건설에 착수했다. 일본부토페스티벌은 완성된 극장의 개관 기념 공연이기도 했다.
"포스트 극장을 세웠을 때는, 지금과 달리 한국 정부도 문화에 예산 따위는 주지 않았던 시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자료관 등도 만들고, 한국무용에 관한 센터를 만들려고 한 거죠. 대학과는 별도의 장소에, 해외에 있는 무용연구소 같은 기관을 만들어 민간무용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김매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극장이 당시로선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일본인의 놀라움에서도 알 수 있었다. 스태프 중 한 사람인 하타 노부코(秦宣子・텔레푸시코루 대표)는 행사 종료 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자에 포스트 극장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었다.
""홍익대학교라는 미술 대학교 근처에 있는 극장은 외벽이 벽돌 구조인 지하 3층, 지상 7층(B3에 분장실과 기계실, B2에 극장, B1에 오퍼레이터 룸과 소수의 2층 객석, 1ㆍ2F에 찻집, 3F에 챠코트 같은 무용 전문점, 4F에 사무실과 무용 전문지 'DANCE ART' 편집실, 그 위에는 연습장 등) 의, 전체가 무용 중심으로 세워진 이상적인 건물로, 정원 200명이라는 크기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토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다." ― (『서울의 일본 부토 페스티벌』 1993 )
이 시기는 한국 무용계뿐 아니라 김매자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교직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무용가로 독립하면서, 동시에 무용 전용 극장인 "포스트 극장"의 건설에 착수했다. 일본부토페스티벌은 완성된 극장의 개관 기념 공연이기도 했다.
"포스트 극장을 세웠을 때는, 지금과 달리 한국 정부도 문화에 예산 따위는 주지 않았던 시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자료관 등도 만들고, 한국무용에 관한 센터를 만들려고 한 거죠. 대학과는 별도의 장소에, 해외에 있는 무용연구소 같은 기관을 만들어 민간무용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김매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극장이 당시로선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일본인의 놀라움에서도 알 수 있었다. 스태프 중 한 사람인 하타 노부코(秦宣子・텔레푸시코루 대표)는 행사 종료 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자에 포스트 극장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었다.
""홍익대학교라는 미술 대학교 근처에 있는 극장은 외벽이 벽돌 구조인 지하 3층, 지상 7층(B3에 분장실과 기계실, B2에 극장, B1에 오퍼레이터 룸과 소수의 2층 객석, 1ㆍ2F에 찻집, 3F에 챠코트 같은 무용 전문점, 4F에 사무실과 무용 전문지 'DANCE ART' 편집실, 그 위에는 연습장 등) 의, 전체가 무용 중심으로 세워진 이상적인 건물로, 정원 200명이라는 크기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토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다." ― (『서울의 일본 부토 페스티벌』 1993 )